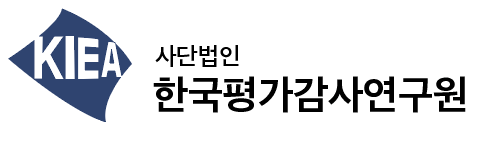(국제개발컨설팅협회 부회장)
공적개발원조(ODA)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기후위기, 보건, 성평등, 디지털 전환 등 개발 이슈가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어떻게” 원조하느냐가 “얼마나” 원조하느냐 만큼 중요해졌고, 그 중심에 평가가 있다.
과거 ODA 평가는 주로 사업에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물의 양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통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성과 측정을 넘어, 정책 학습과 전략적 방향 설정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평가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미래 개발협력의 나침반으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 평가 기준에서도 드러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5대 평가 기준(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틀로 작동하고 있으나, 여기에 성평등, 환경, 인권, 포용성, 현지화 등 새로운 가치들이 접목되고 있다. 평가 방식 또한 다변화되고 있다. 공여국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수원국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평가’가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평가를 가능케 하고 있다. ‘포용성’과 ‘상호성’은 이제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닌, 평가의 실질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ODA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 구조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자체 평가는 독립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원국의 평가 참여 역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우리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성과중심의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는 ODA 통합성과관리 및 정보포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진 평가 기능을 통합하고, 보다 일관되고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ODA 평가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누구를 왜, 어떻게 도울지를 묻는 정치적·윤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핵심 수단이며, 성과 측정을 넘어 개발협력을 위한 공공적 대화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잡해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객관성 있는 평가 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